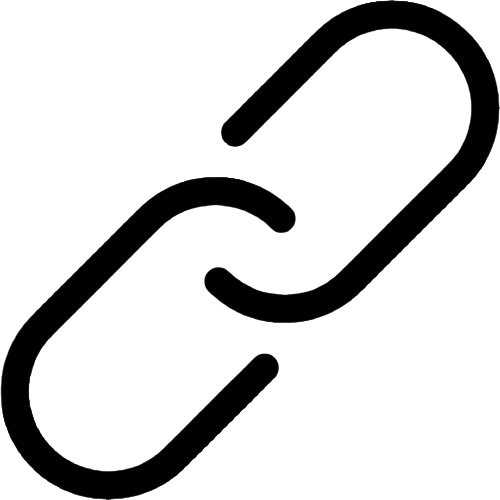언젠가부터 오물풍선 경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눈치챘나.
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대북전단도 없고 오물풍선도 없다.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.
이게 왜 중요한가.
- 그동안의 퍼즐을 맞춰보면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. 만약 북한이 조금이라도 반격을 했다면 윤석열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전면전으로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크다.
- 하지만 북한은 윤석열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.
- 9월에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고 11월에 명태균이 구속되면서 윤석열은 더이상 북한의 공격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. 12월3일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1주일 앞둔 날이었다.

윤석열은 전쟁을 원했다.
- 노상원(전 정보사령관) 수첩에서 “NLL(북방한계선)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”라는 메모가 발견됐다.
- 윤석열은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했고 대북 전단에 확성기 방송에 무인기까지 날려 보내면서 북한을 자극했다.
- 김용현(당시 국방부장관)이 북한 영토에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었다. 김명수(합참의장)와 이승오(합참 작전본부장)가 지시를 따르지 않아 실제로 공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.
-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도 확성기를 설치하고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서 김정은(북한 국방위원장)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적 있었다. 윤석열이 이런 상황을 기대했을 수도 있다.
실제로 전쟁이 났을 수도 있다.
- 윤석열의 무모한 도발이 계속됐다.
- 북한이 오물풍선을 처음 날려 보낸 건 지난해 5월28일이었다. 탈북민 단체들이 5월10일 대북전단을 보낸 데 대한 맞불 조치였다.
- 통일부는 “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”면서도 “자제 요청은 하지 않는다”고 선을 그었다.
- 북한이 6월2일, 오물풍선 살포를 멈추겠다고 밝혔는데도 6월6일 탈북민 단체들이 또 대북전단을 날려보냈다. 북한은 이틀 뒤 다시 오물풍선을 날려보냈다.
- 6월9일에는 남한에서 6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. 이날 저녁 다시 오물풍선이 날아왔다.
- 6월20일 탈북민 단체가 다시 대북전단을 날려보냈고 6월24일 다시 오물풍선이 날아왔다.
- 10월 들어 상황이 더욱 안 좋아졌다. 남한에서 3일과 9일, 10일 세 차례에 걸쳐 평양까지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. 북한이 격렬한 비난을 쏟아냈다.
- 10월15일에는 북한이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를 폭파했다. 남한이 군사 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다.
- 11월16일에는 또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날려보냈고 이틀뒤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또 날아왔다.
- 지난해 남한에서 북한으로 보낸 대북전단이 확인된 것만 73차례, 북한에서 내려온 오물풍선은 33차례다.
- 김용현(당시 국방부 장관)이 오물풍선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한 건 11월28일이었다. 정동영(민주당 의원)은 “합참에서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 다행이지만, 12월3일이 아니라 11월28일에 더 큰 비극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”고 말했다.

북한은 정말 많이 참았다.
- 오물풍선을 그만 보낼 테니 대북전단을 멈춰달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대북전단을 올려보냈고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하면서 도발을 부추겼다.
-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건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라는 관측도 있었다.
- 북한이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를 폭파했을 때 대응 사격을 한 것도 자칫 우발적 군사 충돌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.
- 이승원(시사평론가)은 “뭔가 저쪽에서 좀 격한 반응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무인기로 방향을 돌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”고 지적했다.
2024년 3월 삼청동 안가 회의.
- 22대 총선을 앞둔 무렵이었다.
- 신원식(당시 국방부 장관)과 김용현(당시 경호처장), 조태용(국가정보원장), 여인형(당시 방첩사령관) 등을 만난 자리에서 “시국이 걱정된다”며 “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야한다”고 말했다. 검찰은 이 자리에서 처음 비상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.
- 검찰에서 흘러나온 정보를 종합하면 이 자리에서 신원식과 조태용이 반대 의견을 냈다. 신원식은 여인형을 따로 불러 대책회의를 했다고 한다.
- 윤석열이 총선 이후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내려 보낸 것도 본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하라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크다. 실제로 김용현이 포고령 원문을 작성하는 등 비상계엄의 실행 전략을 짰다.
- 1996년 총풍 사건은 대선용 기획이었지만 윤석열의 북풍 공작은 실제로 전쟁을 유발하려는 의도였다. 만약 원점 타격이 실행됐다면 전면전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.
북한은 왜 참았을까.
- 북한의 대적연구원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윤석열의 도발을 “최악의 집권 위기를 조선 반도에서의 충격적인 사건 도발로 모면하려는 의도”로 규정했다.
- 김장수(전 코리아연구원 원장)은 김정은(북한 국방위원장)의 침묵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.
- 첫째, 남한을 무시했다. “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그 나라를 의식도 하지 않는다”고 말했다.
- 둘째, 윤석열을 멸시했다. “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”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.
- 셋째, 독자 노선 전략이다. 핵 보유국의 지위를 얻고 군사 강국으로 가는 게 김정은의 목표였다.
내란죄와 외환죄를 같이 다뤄야 한다.
-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필요했고 비상계엄을 하려면 전쟁이 필요했다.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들을 전쟁의 위협에 몰아 넣으려했다는 이야기다.
- 형법 92조는 외환유치죄를 “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하거나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”고 규정하고 있다. (전단을 연다는 건 전쟁을 시작한다는 말이고 항적한다는 건 적대 행위를 한다는 말이다.)
- 윤석열이 북한과 통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외환유치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.
- 하지만 무인기 침투 등은 형법 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. “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때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”고 규정하고 있다.
-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공격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이었다.
- 형법 101조는 외환 예비 또는 음모, 선전, 선동을 별도로 규정해 2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. 일반이적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공모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.
드러난 건 빙산의 일부일 뿐.
-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북한 공격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원식(국가안보실장)과 김태효(국가안보실 차장) 등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태다.
- 정동영은 1월13일 기자회견에서 “친위 쿠데타의 컨트롤 타워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”면서 “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”고 강조했다.
- 2023년 6월 김태효가 HID(북파공작원) 부대를 방문한 사실도 뒤늦게 논란이 됐다. 외교 담당인 국가안보실 차장이 HID 부대를 방문할 일이 뭐가 있을까.
결론: 윤석열은 외환죄 혐의를 피할 수 없다.
- 내란 특검법이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1차 내란 특검법은 한덕수(전 국무총리)가 거부권을 행사했고 2차 내란 특검법은 아직 최상목(대통령 권한대행)이 쥐고 있는 상황이다. 1차에는 외환죄가 포함됐는데 2차에서는 빠졌다.
- 접경지 주민들이 고발한 사건도 있고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사건도 있다.
- 지금 당장은 내란죄 재판과 탄핵 심판이 최고의 관심 사안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외환죄(일반이적죄)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.
- 북한에 전쟁을 부추겨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건 전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.
- 내란죄 피의자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 됐는데 외환죄 공범으로 의심 받는 신원식과 김태효 등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.
- 신원식과 김태효 등을 대상으로 외환죄 혐의를 수사하고 윤석열을 추가 기소해야 한다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